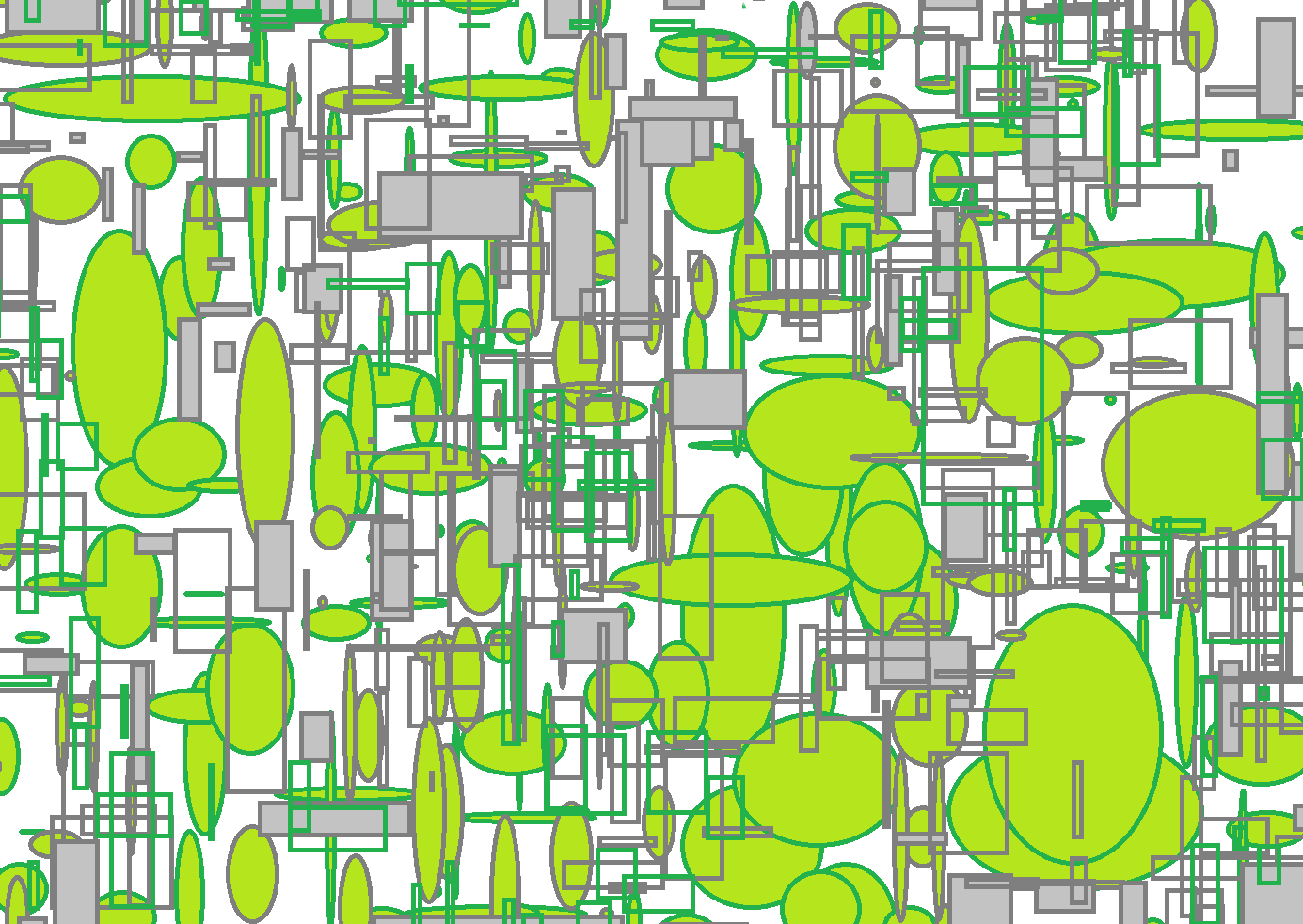생각하면 생각할수록
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
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
두 가지가 있다.
밤하늘에 빛나는 별과
내 마음속의 도덕률이
그것이다.
- 칸트의 묘비명
놀라움과 두려움의 유사성은,
상상할 수 없었음을 자각한 것이고, 낯섬을 인지한 것이며, 이는 곧 나에게 쾌락으로, 삶의 목적으로 다가온다.
생각하면 생각할수록.
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없이 느끼고 겸손을 느끼며, 침묵에 잠겨 모든 것이 비어진다. 타불라 라사로 되돌아가는 이 숙연해짐. 나는 지금 이 글을 적음으로서 그저 놀라움과 두려움을 시로서 전달하고자 하는, -전위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와 대조되는- 측위로서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.
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, 나는 지각으로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. 별이 빛난다고 느끼지 않았다. 그저 상상으로, 고흐의 ‘별의 빛나는 밤’과 같이 더욱 큰 놀라움을 선사할 따름이다. 자연에 대해 나는 현재 울림을 너무나도 느낀다. 이는 곧 자연에 대해 몰라서. 순수가 아닌 순진일 것이다.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, 휩싸임에 의연한 사람은, 그 누구보다도 그 어둠과 빛에 대해 잘 알 것이라.
내 마음 속의 도덕률이라, 이는 두려움이 놀라움에 앞선다. 내 마음은 자연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는다. 혼돈의 바다에서 나는 그저 살고자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. 헤엄을 치는 순간은 나의 사유의 시선에서 빛 기둥을 보았을 때일 것이다. 이는 나에게 목적이고 욕구이며 그 쪽으로 갈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, 그 과정이 나의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승화시킨다.
<철학적 탐구> 107. , 비트겐슈타인
“…마찰이 없는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이지만,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걸을 수 없게 된다. 우리는 걷고 싶다.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찰이 필요하다. 거친 땅으로 돌아가자!”